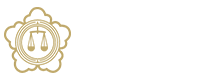5. 불사음과 건전한 부부생활 <김백영의 불교 속 법률 산책>
‘성욕 윤회’서 벗어나는 길, 불사음
불사음은 본능 넘어선 수행
출가, 유전자 명령 거스른 길
절제 없는 자유는 불행 초래
계율은 삶 맑히고 관계 정화
불교의 십중대계 중 셋째는 “음행을 하지 마라”이다. 출가승려는 성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재가자는 부부나 연인 간이 아니면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수능엄경’에 의하면 “만약 음란한 마음을 끊지 않는다면 절대로 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설사 근기가 뛰어나 선정이나 지혜가 생겼다 할지라도 음행을 끊지 않으면 반드시 마군의 길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음욕을 끊지 않고 수행을 한다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다”고 한다.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1976)에서 “생물 진화의 주체는 유전자(DNA)이며, 생물들은 유전자의 자기복제 속에서 만들어진 기계적 존재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유전자의 자기복제는 생존 경쟁의 환경에서 성교의 우위를 점하는 전략에서 출발한다. 인간의 이러한 종족 보존 본능에서 결혼하여 자녀를 가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존재가 출가승려이다. 승려는 생물학적 유전자의 자기복제를 거부하고 독신과 불사음을 선언한 것으로, 이는 위대한 자기 결단이다. 다만 도킨스의 견해에 따르더라도, 문화적 밈으로 출가자들을 승단으로 유인하여 자신의 문화적 유전자를 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간통이 가족 단위인 부부제도를 붕괴시키므로 처벌 대상이었고, 현실에서는 주로 여성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졌다. 기독교 경전에 의하면 “간통한 여자를 예수 앞에 끌고 와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요한복음 8장)라고 묻고 있는데, 간통한 남자는 어디에 있었을까? 아니면 여성이 혼자 간통이 가능할까? 되묻고 싶다.
오늘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보편화된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의 소극적인 외도와 달리,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외도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재산분할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여성의 외도가 이혼과 동시에 맨몸으로 쫓겨나는 결과를 낳았다.
신여성 나혜석(1896~1948)은 당시 엘리트 여성으로, 화가이자 작가, 여성운동가였으나 최린과의 불륜 끝에 이혼당하고 자녀 3명과도 절연된 채 싸늘한 사회적 시선과 외로움 속에서 고군분투하였고, 결국 뛰어난 재능을 꽃피우지 못한 채 행려병자로 사망하는 비극을 맞았다. 삼가 고단한 삶에 깊은 연민을 보낸다.
재산분할 제도가 마련되고 간통죄 형사처벌이 폐지됨에 따라, 전통적 가치와 규범에 구속되어 힘든 삶을 살아온 여성의 지위는 많이 향상되었다. 필자는 판사로 재직 중이던 1990년 6월, 최초로 간통죄 형사처벌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리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26일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간통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을 하면 부부계약상 정조 의무 위반이므로 민법상 이혼 사유가 되고, 상간자와 더불어 위자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보통 사람이라면 손해배상액은 2025년 기준으로 2,000만 원 내외이다.
부부가 외도로 파탄이 나면 자녀의 정신적 충격과 새로운 양육 환경 등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므로, 건전한 부부 관계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약 2,600년 전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전한 성생활은 개인과 사회의 평화를 위하여 여전히 유효할 것이며, 프리섹스가 행복을 가져다줄 수는 없다고 본다. 절제된 성생활에 필요한 불사음 계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