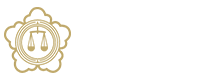머물던 집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집착하는 삶 버리는 출가
진리를 찾아 나서는 결단
과잉보호 속 성장한 자녀
재능 발견 기회 잃을 수도
출가란 세간생활을 청산하고 승려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말하며, 가출은 그동안 속한 집이나 가족을 일시적으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출가는 영구적인 단절, 가출은 일시적 떠남이다. 과거엔 여성 결혼을 ‘출가’, 재혼을 ‘개가’라 했으나, 불평등 상징으로 오늘날 쓰이지 않는다.
불전에 의하면, 싯다르타는 결혼을 하고 아들 라훌라를 낳은 후 29세의 한밤중에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 성을 떠나 출가했다. 이 결단은 출가절(음력 2월 8일)로 기려진다.
출가는 머무르지 않는 삶이자 떠도는 삶이다. 고정되고 머무는 정주의 삶은 집착의 삶이므로, 유행하는 노마드 삶이 바로 출가자의 삶, 즉 운수납자 행각의 삶이다. 이는 문명의 삶이 아니라 야생의 삶이다. 문명은 정착을 통해 축적해 왔지만, 불교는 이를 비판하며 야생의 삶을 회복하려 한다.
사찰의 책임자를 주지(住持)라고 하는데, 이는 정주하여 사찰 재산을 지키는 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불교 본연의 수행자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농경 사회와 정주 사회인 중국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유교의 종법 제도와 결합해 계급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교의 출가 정신은 그대로 살아 있어야 한다. 날마다 출가 정신을 되새기지 않으면 출가가 아닌 가출이 되어 버린다. 당나라의 운문문언은 매일 출가 정신을 유지하면 “날마다 좋은 날[日日是好日]”이라고 말했다. 대승불교에서는 진정한 출가를 삭발과 염의 여부가 아니라, 머무르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바로 ‘금강경’의 ‘응무소주이생기심’이다.
세속에서 가출도 때로는 출가 못지않게 큰일을 하는 원동력이 된다. 정주영은 부모의 만류를 뿌리치고 가출을 해서 막노동판에서 시작하여 현대그룹을 일구어냈다.
조셉 캠벨에 의하면, 전 세계 신화에서 발견되는 영웅의 여정은 전쟁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구하거나, 영적 삶에 대한 비범한 경험을 발견하거나 배우기 위해 가출하고, 이를 발견한 후 다시 돌아와 나누는 과정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십우도 또는 심우도로 표현한다.
따라서 자녀를 너무 보호적으로 양육하려는 것은 자칫 영웅이 될 기회를 빼앗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안목 있는 부모라면 오히려 자녀의 재능을 발견하고 능력을 키우는 자발적 가출을 독려해야 할 것이다. 반면, 부모의 학대나 무관심으로 가출하여 비행 청소년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청소년 보호법과 여성 보호법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학대로 가출한 여성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이들을 위한 쉼터와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 상담과 놀이 시설도 운영되고 있다.
다큐멘터리 ‘마운틴 퀸: 락파 셰르파’(2014)에서는 네팔 여성 락파가 셰르파 집안에서 태어나 남장으로 셰르파 일을 시작한 후, 여성 산악인으로 변신하며 사회적 편견과 싸웠다. 이후 미국인 산악인과 결혼해 미국으로 이주하여 허드렛일을 하며 두 딸을 키웠다. 그러나 남편의 학대로 자존감을 잃고 살다가 쉼터로 자녀와 함께 피신한 후 이혼 재판을 거쳐 영어를 배우고 정규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억압된 삶을 사는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재차 에베레스트 등정에 나섰다. 그녀는 48세에 에베레스트 10회 등정에 성공했다. 진정한 영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