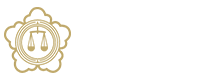7. ‘불음주’와 질서 <김백영의 불교 속 법률 산책>
심각한 파계 막고자 과한 술 경계
동·서양 모두 음주에 엄중
마시되 취하지 말 것 요구
미성년 음주도 엄격 규제
술 대신 맑은 차 어떨까
불자 5계 중 다섯째는 불음주계이다. “술을 마시지 않거나 취하지 마라”는 계율이다. 술은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심신이 이완된다. 그러나 일정한 용량을 초과하여 마시면 취하게 되고, 더 나아가 스스로를 조절할 수 없어 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 없게 돼 혼란에 빠진다. 이처럼 술의 양면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주로 낮에 일을 할 때는 금주하고, 일이 끝난 밤에 마시거나 제사나 잔치, 축제 때 마셔왔다.
음주는 성(性)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로마의 바쿠스처럼 주신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숭모되었으며, 이로 인해 술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중동과 인도 같은 더운 지역에서는 신체 노출이 심한 환경 등을 감안하여 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독교 성서와 이슬람의 꾸란 모두 술의 폐해를 경계하며, 금주 또는 절제를 요구한다. 금주로 인한 대체 기호 음료로 중동에서는 커피가 애용되고, 인도에서는 차가 널리 음용되고 있다. 힌두교 문화권인 인도에서는 일반 식당이나 호텔에서 술을 접하기 어렵다.
사계절이 뚜렷한 중국, 한국, 일본의 중화문화권에서는 술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보여 왔다. 술은 요긴한 기호식품이며, 잔치에서 흥을 돋우고 제사에서는 신이나 조상과 감응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기독교가 서양문화의 기반이 되자 “금주를 하거나 술을 마셔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자리 잡았다. 유교문화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국, 한국, 일본에서는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술 마시는 법도가 지침이다. ‘논어’ 향당편을 보면, 공자는 술을 마음껏 드셨지만, 취하여 절제를 잃을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唯酒無量 不及亂).
시인 이백의 ‘장진주’에는 ‘한번 마시면 300잔(會須一飮三百杯)’이라는 구절이 있으나, 당시 술은 오늘날 소흥주와 같은 알코올 도수 14도 정도로, 이는 호방하게 마신다는 문학적 표현에 불과하며 정신을 잃을 정도의 음주를 찬양한 것은 아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근본으로 한 국가로서 농경사회와 검소한 생활을 지향하였기 때문에 상중에는 금주를 하였고, 가뭄 등 식량 부족 시 금주령을 내려 술 소비를 억제했다. 다만 서민들은 농사일을 하면서 새참으로 막걸리를 즐겨 마시는 정도였다.
중국 하나라의 걸왕이나 은나라의 주왕은 술에 빠져 나라를 잃었고, 많은 명사가 한순간의 술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진 사례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목격했는가.
불교의 재가불자는 기본적으로 술에 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인배나 미성숙자가 술을 마시면 넘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입에 대지 않도록 계율을 강화하는 방편을 쓰고 있다. 이는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보다도 술에 취한 이후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대한 계율 위반이자 세속 법률 위반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처벌하지는 않지만, 음주운전이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으며, 운전면허 행정처분이나 영업정지 처분 등 제재도 있다.
과거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 술은 고가의 기호식품이었으나, 오늘날 한국 사회는 값싼 희석식 소주로 인한 높은 음주율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어느 때보다 금주 내지 절제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가급적 술은 멀리하고 차를 가까이하여 정신을 맑게 하고 지혜의 싹을 기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