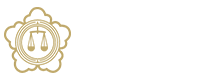8. 거짓말과 정직한 사람 <김백영의 불교 속 법률 산책>
삶을 바로 세우는 정직한 말 한마디
진실은 양심에서 시작돼
거짓은 정의를 무너뜨려
무고는 칼보다 깊은 상처
정직이 가장 오래가는 힘
십중대계 중 네 번째는 “거짓말하지 마라”이다. 거짓말이란 참말이 아닌 것을 뜻한다. ‘쌍윳따니까야’에 의하면 “저울을 속이거나, 동전을 속이거나, 됫박을 속이는 것”을 예시로 들며, ‘수능엄경’에서는 “불법을 알지 못하면서 알았다고 하고, 깨닫지 못하고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대표적인 대망언(大妄言)으로 지적하고 있다. ‘팔정도’는 ‘정어(正語, 바른 말)’를 단순한 금지어가 아닌, 적극적인 수행의 방편으로 본다.
반면, 기독교 경전에 따르면 모세가 야훼로부터 받은 십계명 중 네 번째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출애굽기 20장)이며, 이는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지 않도록 하는 계율이다. 서구 법정에서는 증인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기도 한다. 과거 문맹률이 높던 농경·유목사회에서는 문서 없이 구두로 계약하거나 거래했다. 따라서 분쟁이 생기면 목격자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으며, 허위 증언이 이루어질 경우 진실과 거짓이 뒤바뀌어 정의 실현이 불가능해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십계명으로 거짓 증언을 금지한 것이다.
동서양의 역사를 보아도 허위 고소나 허위 증언으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고초를 겪은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중국 항저우(항주) 서호에는 남송 시기 명장 악비(岳飛)를 모함해 죽음에 이르게 한 진회(秦檜)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진회는 지금도 오라줄에 묶인 형상으로 재현되어 방문객들로부터 침을 맞고 있다. 반면, 악비는 ‘악묘(岳廟)’에 모셔져 왕의 대우를 받고 있다. 조선 예종 때 남이 장군도 유자광의 무고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으나, 훗날 복권되었고 유자광은 파직되어 귀양을 갔다가 유배지에서 장님이 된 채 병사하였다. 프랑스의 잔 다르크도 마녀 재판으로 화형당했지만, 후에 복권되어 루앙에는 그녀를 기리는 성당이 세워졌다.
하퍼 리가 1960년에 발표한 소설 ‘앵무새 죽이기’는 무고와 위증, 인종차별을 주제로 한다. 이야기 속에서 백인 소녀 마이엘라는 흑인 청년 톰을 성적으로 유혹하다 아버지에게 들키자, 아버지와 함께 톰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다. 백인 변호사 애티커스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백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결국 톰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진실보다 편견이 앞서는 사회, 정의가 외면당하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정당한 소득을 얻으려는 건전한 기풍은 점차 쇠퇴하고, 감언이설로 속여 손쉽게 큰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다단계 수법의 영업 활동,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주식 리딩방을 통한 일확천금 사기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새로운 수법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절도나 강도는 물리적으로 피해를 주지만,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반면, 사기는 수법이 매우 교묘하여 형사처벌을 위한 증거 확보도 어렵고, 피해 또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 피해자의 마음속에 허욕이 있거나 지혜가 부족하면 쉽게 꾐에 빠지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재판 실무에서도 고의적으로 형사처벌을 유도하는 허위 고소는 ‘무고죄’,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행위는 ‘위증죄’로 간주되어 사법 정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매우 엄중히 처벌된다. 만약 허위 고소나 거짓 증언으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면, 재심 소송을 통해 누명을 벗을 수 있다. 진리가 승리한다는 믿음과 함께, 무엇보다 정직한 사람은 발 뻗고 달콤한 잠을 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