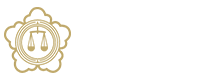9. 부처님 탄생게와 인간의 존엄 <김백영의 불교 속 법률 산책>
존엄의 시작, 탄생게와 헌법 제10조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
신분·명품도 아닌 존재 선언
사회는 외형·신분 따라 판단
행복 누릴 권리는 모두 동일
불전에 의하면 싯달타는 탄생하면서 일곱 걸음을 내딛고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라고 선언하였다고 전한다. 이 탄생게는 중의적 의미가 있다. 겉으로는 부처의 위대함을 존경하는 뜻에서 범부와 다른 탄생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속으로는 모든 인간이 출생의 순간에 이미 완전한 존재임을 일깨워 준다. 우리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근대 국민국가가 태동하기 전까지 인간은 지배와 통치의 대상이었을 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행복을 추구할 여건도 매우 빈약하였다. 인간이 옷을 입기 시작하고 정착 생활을 하면서 옷은 실용적인 기능을 넘어서 신분의 상징이 되었고, 옷에 의해 인간의 가치를 매기고 판단하는 경향이 뒤따르게 되었다. “옷이 날개다”라는 속담이 있고, 우리나라 전래동화 ‘나무꾼과 선녀’에서도 선녀가 나무꾼이 숨겨 놓은 옷을 되찾아 입고 하늘로 돌아가는 모습에서 옷이 날개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여전히 군인은 제복에 의해 계급이 구분되고, 가톨릭 신부는 복식에 의해 지위가 나뉘며, 대학의 학위 가운에 의해 학위가 구별되고, 판사와 검사, 의사는 신분을 상징하는 가운을 착용한다. 근대와 전근대를 가르는 표어 “신분에서 계약으로”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오늘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명품에 집착하는 것도, 명품이 신분을 표상한다고 믿기 때문은 아닐까?
니콜라이 고골의 단편 ‘외투’를 보면, 주인공인 9등급 하급 공무원 아카키 아카키예비치가 남루한 외투 때문에 놀림감이 되자 어렵게 큰마음을 내어 분수에 맞지 않는 비싼 외투를 장만하고 출근한다. 그러자 비로소 주위로부터 파티에 초대받지만 외투를 강탈당한 뒤 억울하게 죽어 유령이 되어 외투에 집착하는 비극을 보여주고 있다.
싯달타는 태어나서 태자로 책봉되거나 출가하여 수행하여 성불함으로써 비로소 존엄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이 태어나 옷을 걸치기 전, 벌거숭이 상태로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에 이미 본래 거룩하고 존엄한 존재로서 이 세상의 고통을 넘어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다만, 존엄한 존재라 하더라도 고통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스스로 걸어서 저쪽으로 가야 한다.
벌거숭이는 청정한 우리의 불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고, 태어나자마자 일곱 걸음을 걸었다는 것은 육도에 머물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초월적·야생적·유목적 삶을 표현한 것이다. 하늘과 땅을 가리킨 것은 천·지·인의 조화로운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모두 문학적 표현이다. 석가모니 부처의 탄생게는 모든 인간이 혈통, 국적, 신분, 재산에 의하거나 수행을 통해 대단한 존재로 변모되어야만 고귀하고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고, 이 세상의 고통을 넘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당시 전제군주제 아래에서 이와 같은 선언을 하셨다는 것은 인류에게 실로 크나큰 광명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이러한 정신을 천명하고 있을 뿐이다. 부처님과 헌법의 정신이 현실 세계에 구현되어, 이 땅에서 거짓과 폭력, 착취가 종식되고 눈물이 마르고 웃음이 가득한 불국토가 구현되기를 발원해 본다.